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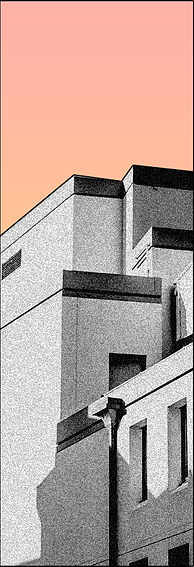

학생이 음악실에 도착한다. 이미 학교에 오가는 이 대부분 다 빠져나갔을 시간. 자물쇠는 단단히 그곳을 지키고 있다.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열쇠를 교무실에 찾으러 갈 필요가 없다. 해답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이 익숙해 보인다. 늘 여기 두기를 벌써 3년째다.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그는 기숙사의 방을 여는 것보다 이쪽이 자연스럽다고 중얼거린다. 문을 옆으로 밀어서 열면 늦은 시간이라, 복도의 빛만으로는 시야가 멀리까지 닿지 않는다. 벽을 더듬어 전원을 찾아 누른다. 달칵.
불이 켜져야 하는데 여전히 어둡다. 그는 불평 없이 걸어간다. 앞으로 갈수록 피아노로 보이는 실루엣이 점점 눈에 익어간다. 이미 자신의 키와 버릇으로 맞춰진 의자에 앉고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지긋지긋한 곡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얼마든 빨리 지나버렸으면. 지겹다는 표정이 되어 피아노를 떠나려고 하다가. 몸이 굳는다. 주위의 빛도 소리도 함께 멈춘 것 같다. 조용하던 음악실에 소리가 들어차는 건 순간이다.
“유령을 봤대.”
“어디서?”
“음악실.”
“우리 그런 괴담도 있던가?”
“있을 법 하지 뭐.”
“그래서 어떤 유령이래?”
실내화를 신은 발만 보였대. 가까이 오지는 않는데, 위가 안 보여도 노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웠대. 떨어지는 건 피눈물이라 청소 당번들이 꽤 놀랐다고 하더라.
그는 이야기의 당사자 중 하나로 소문이 퍼지는 현장을 직접 마주한다. 이것을 정정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를 잠시 고민했으나, 조금도 지나지 않아 귀찮아진 모양이다. 웃으면서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네.’라는 의도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또 일부는 맞는 이야기였다. 실내화가 보인 것도 맞다. 노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낀 것 역시 옳지만 무섭지 않았다. 어떤 허세가 아니라 위협적임을 느낄 수 없음에 가까울까. 떨어진 액체의 높이를 가늠하면 분명 눈물이었을 거라 추측한다. 하지만 피는 아니었다. 덕분에 청소 당번이 곤란할 일 없이 금방 말라버렸다.
“그래도 좀 곤란한가.”
“아, 그러고 보니 영이 넌 피아노 쳐야 하니까.”
괜한 소리가 더 돌기 전에 간단히 이야기에 합류해 본다. 정작 자신은 본 적 없지만 이런 소문 때문에 연습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슬쩍 전해둔다. 가십이야 많고 좋은 친구들은 이런 말도 금방 뿌려줄 것이다.
정말 문제는 그 유령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이다. 구경꾼이 파하느라 더욱 늦은 시간. 처음의 조우는 창가 근처더니 다음에는 학생 의자이었다. 조금씩 거리를 좁히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바로 피아노 근처까지 와있다. 아무래도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대도 신경이 쓰인다. 그렇게 무딘 인간은 몇 알고 있지도 못하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9살의 피아니스트는 연습 시간 하나를 빼먹는다고 들을 소리가 더 빤하고 무서웠다. 결국 유령을 울도록 세워두고 연주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퍼진 소문이 괴담에서 연애담, 추문, 또 다른 괴담으로 바뀔 무렵. 음악실에서는 유령과의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음악실 학생은 저도 모르게 대담해졌다.
“왜 여기 온 거야? 언제까지 있을 거고.”
이미 몇 번 물어보고 싶었던 말을 뱉은 것이다. 다른 존재는 무언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말을 이어간다. 처음에는 궁금증이더니 나중에는 자신의 추리를 말한다. 어디서 들었던 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혹시 버려진 사람인지, 뭔가 기다리는 게 있는지, 음악은 좋아하는지, 자신이 누군지 아는지. 틈 없이 쏟아낸다. 끝으로 갈수록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건 말할 사람이 필요 때문이다. 유령은 여전히 말이 없다.
“좋아하는 노래 있어?”
끼익거리며 음악실 바닥이 울린다. 유령 그림자는 모처럼 실체를 가진 것처럼 움직인다. 마침내 피아노 의자에 앉으면 처음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체구가 작고 어리다. 건반에 손을 올리는 것 같다. 그 자리를 보고 마찬가지로 손을 올린다. 연탄곡이라도 치는 모양새가 된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곡이 연주된다.
익숙한 곡이다. 돌고 도는 회전목마. 연주되는 피아노곡 쉼표사이 마다 말을 걸어온다. 우리는 닮았어. 그러니까 옆에 있어 줄게. 이미 그러기로 했었잖아. 그런 적 없는 일인데도 쉬이 받아들여진다. 여전히 위협도 두려움도 없다. 오히려 익숙하게 끄덕일 뿐.
해가 넘어간지 오래. 음악실 밖으로 나오는 이에게 동급생이 살갑게 말을 건다.
“이제 가는 거야? 같이 갈까?”
“아니,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앞의 사람은 의아한 표정이지만 그저 웃음으로 무마하고 자리를 뜬다. 학교에 퍼진 소문은 연애담에서 추문, 또 다른 괴담에서 다른 이야기를 퍼트릴 준비가 되어있다.







